노후파산, 막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vm.data.subtitle }}
{{ vm.blogModifiedDate }}
노후파산,
막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강연자) 김경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최고책임자 및 대표이사
(원본영상)
Q.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월급이 없어지는데, 월급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 CASH FLOW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해결책
Q. 얼마정도가 되면 노후가 충분한지?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가?
• 5억이 있으면 될까?
2000년 초반에는 가능했다.
1년에 이자만 4000만원이기 때문.
• BUT 금리가 1%라면?
5억이더라도 1년에 이자가 500만원 밖에 안나온다.
• "얼마의 금액의 자산을 목표로 할 것인가?" 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 금리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내가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월급이 있어야할까?"
: 목표하는 자산 금액이 아닌, 은퇴소득으로 계산해볼 것.
Q. 그렇다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 10년 전에는 은퇴소득 300만원 벌기를 목표로 했었다.
• 현재 시점 중산층을 기준으로 퇴직 후 2인 가구 기준 400만원 정도
• 앞으로는 물가에 따라 또 상승할 것.
Q. 근로소득으로 만들라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는 70살인데, 최대한 그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할 것. 그러기 위해 미리 자산관리가 필요.
Q. 대한민국 고령화는 어느정도로 문제인가?
• 세계에서 제일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 저출산과 장수가 모두 극과 극으로 향하고 있다.
• 결국에는 물귀신처럼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
• 전체를 42.195km 풀코스 마라톤으로 비유해보자면 현재 시점은 약 5km 정도 지점일 뿐.
•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보일 것.
일본의 1인당 GDP 소득이 30년 째 거의 동일
→ 그렇다면 30년 전 이미 달성한 후 생산성이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것 아닌가?
→ 현실은 일본의 일을 하는 계층, 즉 노동시자에 있는 사람들의 1인당 생산성은 미국보다 높다.
→ 고령화로 인해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변동이 없는 것.
• 우리나라 장기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인구 때문.
Q. 나이 들 수록 경계해야 할 비극은 무엇인가?
•노후파산 : 아직 살아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
•장수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돈이 결정한다.
•사람이 호랑이보다 오래 사는 이유?
1) 돈
- 미리 저축해두었다가 나이가 들었을때 다른 필요한 것들과 바꿀 수 있다.
2) 효
- 자녀의 부양
- BUT 인구가 피라미드형태일때만 가능. 역피라미드에서는 '효'라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3) 연금
- 이것 역시 젊은 층 자체가 사라지면서 축소 중
•결국 남은 것은 1번 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산관리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Q.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젊을 때 (10대, 20대, 30대) : 그 사람의 잠재성
- 미래를 보고 가치 평가. 아직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잠재성.
•나이 들었을 때 :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것
- 이미 패를 다 아는 상황.
•나이가 들 수록 자신의 자산을 기반으로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Q. 연금 관리를 망치는 습관은?
연금을 잘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내가 직접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대개 늦춰서 받는 게 장수사회에서는 더 나은 편.
- 우리나라 max 5년, 일본 max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
- 일본은 10년 늦추면 80%를 더 받고, 우리나라는 5년 늦추면 36%를 더 받는다.
•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등)
1) 절대 중도에 돈을 인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자산 축적 방법 : 저축액의 크기, 저축의 기간, 운용 수익률
-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축액의 크기
2) 예금 보다는 자본을 담고 있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 우리나라 DC형의 80%가 예금을 갖고 있다.
BUT 예금 ≠ 자본
자본 =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는 것.
원금 보장 = 원금의 가치도 안 오른다.
Q. 자본이라고 하면 부동산 vs. 주식?
•둘 다 똑같은 자본인데 사람들이 이 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다르다.
•부동산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주식을 살 때는 당장 내일 지수가 떨어져도 흔들려한다.
•그런 면에서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땅을 사면서 내 대에서 안오르면 자식의 대에서 오르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식을 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각 나라 별로 경제의 중심이 되는 자본 시장을 봐야 한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이 경제를 흔들고,
- 미국은 주식시장이 경제를 흔든다.
- 미국 연금의 80% 이상은 주식에 들어가 있다.
- 중심 시장에 따라 각 나라가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자본이 다를 것.
Q.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본다면?
•부동산 비중의 일정 부분을 다른 금융자산으로 돌리는 준비도 필요하다.
•향후 20년 후: 26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20대~50대 가구는 감소, 60대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 이상 증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모습은 결국 늙어간다는 것.
•즉,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
•우리나라에 집중된 부동산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ex. 리츠
Q. 퇴직 후 30-40년을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 또한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일을 이어나가는 것.
• 젊을 때 "일 하는 것" : 돈을 벌기 위함, 재미, 등등
•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 : 돈도 돈이지만 보다 비재무적으로 이어져 감.(관계망을 갖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등의 의미)
Q. 노후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 우리나라의 조직화된 잡마켓에서는 퇴직 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 이를 타파하려다가 찾는 것들이 자영업인 상황 (편의점, 치킨집 등등)
•그러나 이런 소자본창업을 경계해야한다.
- 나도 모르게 몇 번만 실패해도 노후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 베이비부머 세대와도 경쟁해야하는 것.
- 결국 인테리어나 임대업자가 자영업자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기술 =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것.
ex.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재취업
- 니치 마켓을 노려라.
- 요즘 교육시장도 모양새가 점점 변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강연자의 강연 내용을 어니스트 금융브리핑 가이드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구독자들을 위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당사 의견을 대변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사항이나 콘텐츠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onestbriefing@honestfund.kr
고객센터 : 02-565-8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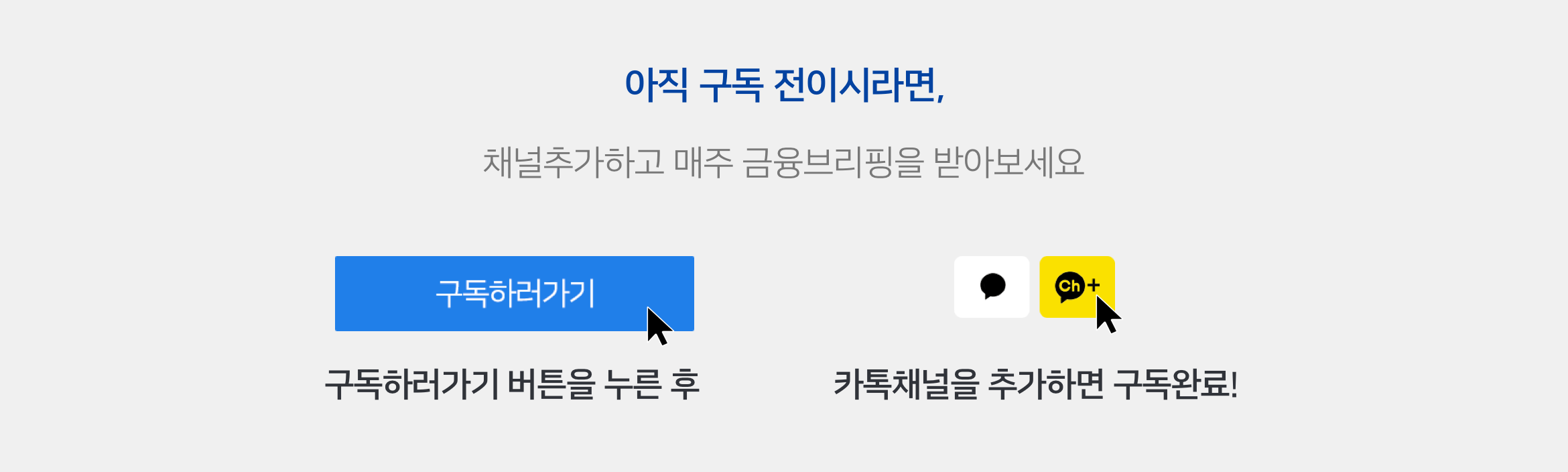
주요 공시 정보
- 누적대출금액
- 조 억 원
- 대출잔액?
대출금액 중 상환이
예정 되어 있는 금액 - 조 억 원
- 연체율?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된 비율 - %
-
분류종합상세구분{{ detailType }}누적대출금액대출잔액손실률연체수{{(delayCount | number)}}{{(vm.selectedLoanDate.totalDelayCount | number)}}연체율
이 사업 공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님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입니다.
일부 상품(소형PF, 법인부동산, NPL, (구)개인신용, 홈쇼핑, 동산담보)의 경우 신규 상품 취급 없이 연체 중인 채권만 남아 있어 공시된 연체율이 높습니다.